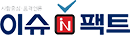[이슈인팩트 이완재 기자] 가을이다. 오곡백과(五穀百果) 풍성하게 익어가는 계절이다. 주말에 편찮으신 어머님도 뵐 겸 고향마을에 다녀왔다. 11월 초순에 시골 논은 추수를 마친 논배미가 무채색 맨땅을 드러내고 있었다. 농사꾼이 아니니 농작물의 수확 시기를 알 길이 없지만 벼 베는 시기는 지났다는 의미다. 알밤도 다 털고 고향집 들판에는 이제 손길이 채 미치지 않은 감과 대추 등이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다. 고구마도 한창 수확을 하고 있었다.
얼마 전 고향으로 귀촌한 작은형님이 초등생 주먹만한 크기의 먹감을 곶감용으로 깎아 놓았다. 유년 시절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맘때쯤 곶감을 깎아 말리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늦가을이면 홍시가 되기 전 적당히 단단한 감을 따 일일이 껍질을 깎았다. 껍질을 깎아 낸 감은 싸리나무에 10개씩 꿰어 그렇게 열 개를 짚으로 엮은 새끼줄로 묶는다. 곶감 한 접은 총 100개의 감이 사용된다. 헛간 지붕 밑에 매달아 한 달여 가까이 말리면 꾸덕꾸덕해진다. 적당히 말랑할 정도로 말랐을 때 아버지는 싸릿대에 꿴 곶감을 한쪽으로 밀어붙여 가지런하게 곶감 모양을 만든다. 그리고나서 싸릿대 가장자리를 잘라 그 끝을 낫 등으로 탁탁 쳐 하얀 꽃 모양으로 만들어내면 곶감이 빠지지 않는다. 이 작업을 ‘곶감 접는다’고 표현했다. 다시 옹기 항아리나 상자 안에 저장해 두면 하얀 분이 생기는데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곶감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곶감은 눈 내리는 겨울밤에 간식으로 또 조상님 제사상에도 오른다.
곶감을 말릴 때면 중간에 곶감이 완성되기 전, 하나 빼 먹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이를 알고 아버지는 지혜를 발휘 하셨다. 싸리나무에 꼭 10개만 꿰어놓는 것이 아니라 한 두개 자투리 감을 더 꿰어놓으신다. 그것은 한 달여 가까이 말라가는 곶감을 뻔히 쳐다봐야하는 어린 아들의 고통을 감안한 일종의 배려다. 중간중간 그걸 빼내 자식의 입에 넣어주신다. 가을볕을 맞으며 먹는 그 맛의 달콤함이란 표현 불가다. 지금보다 넉넉하지 않은 생활에 먹거리가 부족했을 때이니 그 곶감 맛은 아주 특별했다. 첩첩이 산인 고향은 감이 흔했고 가을이면 집집마다 곶감 말리는 풍경이 연중행사요 일상이었다. 뉘 집 자식은 간 크게도 이 곶감을 어른 몰래 두어줄 씩이나 빼 먹다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소동도 벌어지곤 했다. 지금은 그 자식들이 또 그 나이대 아들을 낳고 50, 60줄을 바라보고 있으니 인생무상(人生無常)이다.

옛날 방식은 아니지만 지금도 고향에서는 곶감 말리는 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일일이 칼로 깎던 곶감은 기계나 감자칼 같은 것으로 돌려 깎아 훨씬 편하고 빨라졌다. 높다란 지붕 처마 밑에 매달아 말리던 것은 비날하우스 안으로 장소가 바뀌었다. 감을 끼워넣던 싸리나무는 이제 구하기도 번거로워 볼 수 없다. 대신 공장에서 만들어진 플라스틱 곶감걸이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곶감도 편리한 세상을 만나 호사를 누리는 건지, 사람이 옛것의 진부함을 거부한 건지 모를 일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곶감맛이 똑같을지도 솔직히 의문이다. 이제 쉰을 바라보는 나이니 지금 먹는 곶감은 추억을 먹는 일이 됐다. 문득 곶감을 떠올리니 막내 아들 사랑이 달큰한 곶감만큼이나 각별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