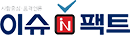[이슈인팩트] 이준서계와 이낙연계가 따로국밥식 합종연횡으로 뭉친 제3지대 개혁신당이 총선 지휘권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며 분당 수순을 맞고 있다. 체질적으로 다른 정파들의 화학작용으로 탄생한 불안한 계약동거가 붕괴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오늘(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고하며 분당이냐 봉합이냐 절대기로에 놓였다.
이날 국민의힘에서 빠져나와 기존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공동대표 측과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가 개혁신당에 합당 형식으로 합류한 이낙연 공동대표 측이 총선 주도권을 놓고 격돌했다.
이낙연 공동대표 측에선 합당 파기도 거론하고 나서 지난 9일 사인한 합당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갈라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양측은 선거 정책 지휘권과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및 공천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앞서 이준석 공동대표는 선거 정책 전반 지휘권, 최고위가 배 전 부대표에게 비례대표 불출마 선언이나 과거 발언을 사과하도록 결정, 지도부 전원의 지역구 출마 등 세 가지를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요구했다.
이에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합당 합의상 선거 총괄의 전권은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있고 관련 내용은 최고위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다. 배 전 부대표 문제에 대해선 '배제의 정치'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의 갈등은 3차 정례 최고위인 16일 회의를 하루 전인 15일 취소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잡았다가 회견 1시간 전 취소하고 19일 최고위에서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결국 이준석 공동대표의 뜻대로 이날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에서는 총선 선거 운동 및 정책 결정 권한을 이준석 공동대표에 위임하고, 해당 행위자에 대한 심사위원회 설치 안건 등을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회의장 내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 등 새로운미래 출신은 선거 운동·정책 결정 권한 위임 표결엔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선거 운동·정책 권한 위임은 곧 선거의 전권을 달라는 것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낙연 공동대표라는 합당 원칙을 '다수결'로 깼다고 반발했다.
김 최고위원은 회의장에서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두환이,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보위를 만들어 다 위임해달라며 국회를 해산한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후에도 "헌법에도 당헌·당규에도 없는 비상 대권을 주는 것은 대부분 쿠데타 할 때 주는 것"이라며 "이준석 사당화 결정이며, 통합정신을 깬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합당 선언 무효화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의 공식적 절차를 앞세워 사당화를 의결하고 인정하기를 요구했다. 통합 합의를 깨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입장문까지 냈다.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오후 내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갈라선 형국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갈등을 봉합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총선이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데다 각 세력이 뭉친 근본적 이유가 총선 승리인 만큼 하루 속히 갈등을 수습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번 내홍이 봉합되더라도 조만간 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천 국면에 가면 양측의 주도권 다툼은 더욱 심각하게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