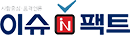[이슈인팩트] 출근길 아침에 작은 텃밭을 일구는 도심 농부의 부지런한 호미질이 기자의 눈에 포착됐다.
일흔은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이는 노인의 손에 쥐어진 호미질이 능숙하다. 아파트 건설이 한창인 모델하우스 뒷편 작은 자투리 땅을 일구는 것이다. 벌써 수년 째 목격되고 있다. 멀리 도시 변두리에서는 가능하나 도심 한가운데라면 보기 힘든 풍경이다. 대충 무허가 경작지로 보이나 소유주와는 구두로 협조가 된 느낌이다. 어떨 땐 할머니도 함께 나와 일을 거든다. 서너 평 남짓한 땅에 심어진 작물이래야 마늘, 완두콩, 고추 등이 고작이다. 근처 시내에 살고 있을 노인이 자저거를 끌고나와 금지옥엽으로 땅에 공을 들이는게다. 어쩌면 두 노인에겐 취미생활과 힐링이 되어주는 작은 놀이터 같은 곳인지도 모른다.
문득 어린 시절 고향마을의 땅의 정서가 떠올랐다. 가난한 집은 잘 사는 부자집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 신세를 벗지 못한다. 힘들게 1년 농사를 지어서 그 결실로 얻은 곡식의 상당량을 주인에게 주는게 상례다. 그러고도 이듬해 봄에 다시 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부잣집에 찾아가 읍소하고 무언가 선물이라도 바쳐야 또 차례가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게 어렵게 여러 집의 소작농을 지어 소도 사들이고 땅도 샀던 억척 같던 우리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많았다. 빈촌 마을 시골에서는 그렇게 키워 아이들을 대처에 대학도 보내고 훌륭하게 키워냈다. 화전민이 일군 땅, 높은 산간지대의 천수답 같은 열악한 황무지를 문전옥답으로 만들던 개척정신이 그때는 생존을 위해 필수이던 때다. 또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통용되던 시절의 얘기다.
그새 세상은 놀랍도록 몰라보게 바뀌었다. 아파트 세상이 된 도시의 땅은 금싸라기 땅이다. 때론 힘 있는 권력자들이 배후에서 음습하게 얽혀 분탕질을 하는 투기와 금권의 땅으로 바뀐지 오래다. 정부가 나서서 땅값을 통제하고, 그 땅의 소유를 놓고 희노애락이 일상으로 일어나는 곳이 도시다. 땅의 가치, 땅이 갖는 의미가 같은듯 다르게 바뀐 오늘의 현실이다.
변하지 않는게 있다면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김 매고 키워서 결실을 맺는 것은 한결 같다. 어쩌면 저 노인은 그런 땅에 희망을 뿌리고 거두는 일에 남은 생의 작은 기쁨을 걸었지도 모른다.